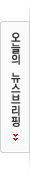입력 : 2015.03.05 09:42 | 수정 : 2015.05.24 10:32
때로 운전은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곳인지를 일깨워 준다. 어느 나라나 정체 심한 대도시 도심에서의 운전은 비슷한 모습이긴 하지만, 서울에서의 운전이 빚어내는 남다른 정서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단 몇 미터를 먼저가기 위해 바늘 같은 틈을 놓치지 않고 끼어드는 치열함.
그 끼어듦을 마치 자신의 전 생애에 대한 틈입인 양 응징하고 마는 비장함.
이 메트로폴리스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주 잠시 몽상에 빠진 자에게 그리스 비극의 운명을 알리는 코러스처럼 울려퍼지는 경적들.
자동차의 깜빡이는 대체로 옆 차선 운전자들에게 ‘적이 끼어들려 하니 틈을 주지 말고 미친 듯이 밟으시오’라는 우리 고유의 새로운 의미를 전달한다. 그래서 고도의 심리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상대의 허를 찔러 깜빡이를 켜는 것과 동시에 차 머리를 옆 차로로 들이미는 ‘내 진의를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전술.
운전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분을 보면 일단 멈춘다. 그래도 보행자는 백이면 백 건너지 않고 내 눈치를 살핀다. 다시 먼저 건너가시라고 손짓을 하면, 그제서야 꾸벅 목례를 하고 건너간다.
시인의 말처럼 작은 일에만 분노하는 나는 이럴 때 화가 난다. 신호등은 없지만 횡단보도인데 도대체 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정지선에 당연히 정지한 운전자에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법이 인정하는 보행자의 권리다. 그들의 그 처연한 ‘학습효과’가 서글프다.
그런 서글픔을 느낄 때면 종종 운전석에서 느꼈던 다른 사회의 모습들이 문득 떠오르곤 한다.
단 몇 미터를 먼저가기 위해 바늘 같은 틈을 놓치지 않고 끼어드는 치열함.
그 끼어듦을 마치 자신의 전 생애에 대한 틈입인 양 응징하고 마는 비장함.
이 메트로폴리스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주 잠시 몽상에 빠진 자에게 그리스 비극의 운명을 알리는 코러스처럼 울려퍼지는 경적들.
자동차의 깜빡이는 대체로 옆 차선 운전자들에게 ‘적이 끼어들려 하니 틈을 주지 말고 미친 듯이 밟으시오’라는 우리 고유의 새로운 의미를 전달한다. 그래서 고도의 심리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상대의 허를 찔러 깜빡이를 켜는 것과 동시에 차 머리를 옆 차로로 들이미는 ‘내 진의를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전술.
운전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분을 보면 일단 멈춘다. 그래도 보행자는 백이면 백 건너지 않고 내 눈치를 살핀다. 다시 먼저 건너가시라고 손짓을 하면, 그제서야 꾸벅 목례를 하고 건너간다.
시인의 말처럼 작은 일에만 분노하는 나는 이럴 때 화가 난다. 신호등은 없지만 횡단보도인데 도대체 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정지선에 당연히 정지한 운전자에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법이 인정하는 보행자의 권리다. 그들의 그 처연한 ‘학습효과’가 서글프다.
그런 서글픔을 느낄 때면 종종 운전석에서 느꼈던 다른 사회의 모습들이 문득 떠오르곤 한다.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소박한 공항에 내린 후, 허니문인데 영화 한번 찍어 본다고 빨간 무스탕 컨버터블을 렌트했다. 그런데, 신부 앞에서 폼 잡으며 앉을 때까지는 탐 크루즈였는데, 시동을 걸고 출발한 후에는 미스터 빈이 되어 버렸다.
도대체 이놈의 미국 차는 왜 이렇게 커 보이는 걸까. 그때까지 소형차 외에는 몰아 본 적 없고 공간지각력이 한심한 수준인 나로서는 코너를 돌 때마다 무언가를 지이익 긁고 있는 환각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대쉬보드에 웬 버튼은 이렇게 많은지. 비상등을 켠다고 뭘 눌렀더니 위이잉 지붕이 올라오고.... 해는 져서 어두웁고 깎아지른 해안절벽 편도 1차로 도로를 가는데, 옛날 영화음악실에서 단골로 들려주던 바하의 파이프오르간 음악을 배경으로 한 ‘훼~드라’라는 절규가 자꾸 들리는 듯 하고, 천사가 질투하여 데려간 애너벨 리의 바다 옆 무덤이 보이는 것 같고.
운전대가 생명줄인 양 두 손으로 부여잡고 눈 옆을 가린 경주마처럼 앞만 뚫어져라 응시하며 시속 30킬로미터로 설설 기어가는데, 캘리포니아 분위기 내려고 일부러 준비해 온 비치보이스의 노래 코코모(Kokomo)가 어느새 메탈 밴드 AC/DC 노래로 바뀌어 들리는 환청까지 들리더라. Highway to Hell!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비로소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은 나는 룸미러를 힐끗 보았다. 그런데, Oh, my, god.
내 뒤에는 족히 1킬로미터는 되어 보이는 차량의 행렬이 마치 묵언수행중인 수녀들의 행렬마냥 묵묵히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이 절벽 도로를 혼자 고독히 가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다.
2. 처가 여고생 시절에 겪은 일이다.
하교길, 이태원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다. 중앙선 근처까지는 왔는데 도대체 차들이 뻔히 보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씽씽 지나간다.
두 손으로 책가방 손잡이를 부여쥔 채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드디어 차 한대가 중앙선 옆 1차로 정지선에 멈춰 섰다. 날렵한 오픈카에, 썬그라스를 낀 백인 청년이었다.
그런데, 2, 3차로의 차들이 계속 씽씽 지나가고 있어서 여전히 건너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다. 갑자기 이 백인 청년, 차를 90도 직각으로 우회전하여 바깥 차로 전부를 차로 막아버리고는, 싱긋 웃으며 지나가라고 손짓을 하더라는 것이다.
...다시 물어봐도 영화 아니고 실화 맞단다.
3. 유모차에 애를 태우고 떠났던 사이판 여행 때 일이다.
사이판 사람들, 특히 원주민인 차모로 인들은 열대인들 특유의 여유로움이 넘쳤다. 유모차를 끌고 한적한 밤길을 걷다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들이 몇 대 오기에 놀라서 섰다. 그런데 맨 앞의 큰 차가 딱 멈추더니 덩치가 내 세 배쯤 되는 사람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다. ‘사이판 조폭인가?’하며 내심 떨고 있는데, 유모차 쪽을 보고 벙긋벙긋 웃으며 애한테 애교를 보내더니 손짓을 하며 어서 먼저 건너가라고 하더라. 그 차 뒤에 늘어선 여러 차들도 아무 불평 않고 싱글벙글 대며 기다리고 있고.
떠나는 날 새벽 2시 40분. 사이판 공항 대합실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게이트가 열리자마자 그 숱한 한국인 승객들이 경주하듯 0.5초 내로 달려와 서고 경비원은 one line, please(한 줄로 서 주세요)!"를 외쳐대는 순간, 아 벌써 조국에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온 인천 공항은 너무나 멋졌고, IT강국답게 공중전화마다 현란한 모니터 화면이 달려 있었다. 아마 사이판 사람들이 이 공항에 와 본다면 미래첨단도시에 온 사람들처럼 눈이 휘둥그래질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과연 삶의 질 자체는 어떨까. 우리의 삶의 질은 그들보다 나을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들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낯선 이에게 보내지 못할까.
인간사회를 평가하는 데에 꼭 거창한 이념과 경제지표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타인에 대한 작은 배려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회야말로 건강한 사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