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 4
- 더보기
입력 : 2016.05.25 03:00 | 수정 : 2016.05.25 08:56
[37] 농민의 땅 고창(高敞)과 보리밭 주인 진영호
관찰사 이서구, 선운사 미륵불 열다가 날벼락 맞을 뻔
망하고 또 망하고… 14만 평 보리밭 일군 농부 진영호
조병갑 학정에 들고일어난 농민군… 고부까지 진군해
동진강변에는 학정 상징하는 만석보 기념비 서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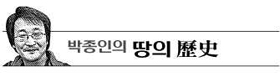
도통(道通)한 전라감사 이서구
실학자 이서구(1754~1825)는 기인이었다. 우의정을 지내고 1793년에 이어 1820년 두 번째로 전라관찰사로 부임한 이서구는 곳곳에 전설을 남겼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보고나 받았으면 모르되 이서구는 남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백성들 삶을 눈으로 확인했다. 선정(善政)이 많다 보니 공적비도 많고 전설도 많다. '물은 30장을 내려가고 땅은 30장을 오르리'라고 예언했다는 부안 바다는 새만금 간척지가 되었다. '이 누각 앞으로 화마(火馬)가 다니리'라 예언한 전주 한벽루 앞에는 기차 터널이 뚫렸다.
만물에 관심이 많던 이서구인지라, 고창 선운사 마애미륵불을 지나치지 않았다. 미륵불 배꼽 복장에는 세상을 바꿀 비결이 감춰져 있다고 했다. 부임한 지 며칠 만에 이서구가 사다리를 타고 복장 뚜껑을 열고 비결을 펼쳐 보았다. 첫 장을 펼치자 이리 적혀 있었다. '이서구가 열어 본다(이서구개탁·李書九開坼).' 날벼락이 몰아치고 이서구는 비결을 쑤셔 넣고선 회로 봉해버리고 물러났다.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지러운 조선을 어찌 일신해보려는 뜻도 있었을 터다. 더군다나 비결이 있는 곳은 미륵불, 바로 중생을 구원하는 미래불 배꼽이 아닌가. 자그마치 56억7000만년 뒤에 찾아올 부처다. 그 세월이 하도 길기에 이서구는 복장을 열어 보려다 죽다 살았다. 마애불로 오르는 선운사 산길은 지금, 초록이 눈부시다.
보리의 땅 고창과 진영호

고창 옛 이름은 모양성이다. 모양은 보리 모(牟)에 볕 양(陽)이다. 백제 때는 털 모(毛)자를 썼다. 땅이 척박하다 보니 고창은 옛날부터 보리농사를 지었다. 눈은 더 많았다. 워낙 폭설이 잦아서 사람들은 고창(高敞)이 아니라 설창(雪倉)이라 불렀다. 진영호는 그 고창에서 태어나 지금 고창에 산다. 직업은 농부다. 14만 평짜리 보리밭을 가는 어마어마한 농부다. 농장 이름은 학원농장이다.
함평 대지주 집안에서 시집온 어머니 이학은 꿈이 농장이었다. 1963년 진영호가 중학교 때 이학은 시집이 있는 고창 황무지 6만 평을 샀다. 마을 사람들이 땔감용으로 소나무며 잡목들 베어내는 쓸모없는 돌밭이었다. 50년 만에 6만 평이 14만 평이 되었고, 돌밭은 1급 농경지로 변했다. 사연이 간단하지 않다. 진영호가 말했다.
"어머니와 영화를 보러 다녔다. 영화라는 게 늘 '자이언트' '에덴의 동쪽'이었다. 하나같이 미국 텍사스 대농장이 배경이었다. 농장주가 되는 게 어머니 꿈이었다." 진영호는 당연히 농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랐고, 농장을 경영하려면 당연히 농경제학과를 가야 하는 줄 알았고, 서울대 농경제학과에 들어갔다. 주말이면 과 친구들과 고향에 내려와 밭을 갈았다.
1971년 졸업과 동시에 진영호는 일제 경운기 하나 사서 고향으로 내려왔다. 고창군 내에 경운기가 10대가 채 없던 때였다. 뽕나무 심고 누에를 쳤다. 당연히 망했다. 터가 너무 넓었고 잠업(蠶業)에 대한 실무적 이해가 없었다. 경운기 고치려면 광주까지 나가야 했다. 그가 말했다. "이론과 실제는 전혀 달랐다."
바보 농부 진영호는 1년 반 동안 돈 다 까먹고 대기업 금호그룹에 입사해 20년을 살았다. 이란과 일본에서 상사맨으로 뛰다가 이사를 끝으로 고향으로 복귀했다. 친구들도, 가족들도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했다. 1992년이었다.
황무지가 보리밭이 될 때까지
언덕에는 수박을 심었다. 길 건너 언덕에는 카네이션과 백합 비닐하우스를 차렸다. 수박밭 6만 평을 수확하니 이익보다 인건비가 더 들었다. 망했다. 카네이션 팔아서 벌충하려 했더니 원예시장이 개방되면서 중국산 카네이션이 절반 가격으로 들어왔다. 망했다. 그가 말했다. "손대는 작물마다 망해나갔다. 갖고 왔던 돈은 없어지고 빚만 늘어가더라. 경험 없는 초보 농부가 처음에 농사를 잘한다. 지가 천재라 그런 줄 안다.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얘기다. 다 땅이 주고 하늘이 주는 거다. 내가 그랬다. 자만심 가득한 초짜 농부."
1990년대 초, 대한민국 농민들이 대부분 그랬다. 농업시장이 개방되고 전통적인 내수시장은 쪼그라들고 있던 때였다. 분기탱천한 다른 농부들이랑 서울 여의도에서 죽창 들고 화염병도 던져봤다. "막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안 될 걸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오기가 나고 용기가 없어서 버릴 수가 없었다."

1994년 갈아엎은 수박밭에 보리를 심었다. 이문은 적어도 인건비가 덜 드는 작물이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사진을 찍고 갔다. 그 사람들이 뿌리고 간 돈이 제법 되었다. 신기했다. 그래서 2003년 보리를 수확한 밭에 콩 대신 메밀을 심어봤다. 무려 20만명이 소금 같은 메밀꽃을 보러 몰려왔다. 진영호가 말했다. "짜증이 났다. 농사에 방해가 될 정도였으니까." 그때 군청 농업진흥과 직원 김가성이 말했다. "진 사장, 이거 축제로 만들자."
그리되었다. 수확을 포기하고 관광으로 발상을 전환하니 짜증이 사라지고 돈이 보이는 게 아닌가. 긴가민가하며 부둥켜안고 있던 카네이션 비닐하우스는 그해 겨울 고창을 뒤덮은 폭설로 100% 전파돼 버렸다. 그가 말했다. "하룻저녁에 전부 사라졌다. 그때 받은 보상금으로 하우스 다 철거하고 빚 갚았다. 폭설이 없었다면 지금도 질질 끌려와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한번 이름이 나고 나니 이듬해 봄 언덕을 뒤덮은 보리밭에 30만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6월에 보리를 베고서 메밀을 뿌렸던 그해 가을, 고창 전역에 교통 체증이 발생해버렸다.
2006년에는 보리와 메밀 사이에 해바라기를 심었다. 한겨울을 제외한 1년 365일 농장 일대는 꽃만큼이나 사람이 몰려들었다. 소위 '경관 농업', 수확보다 미관을 중시하는 농업이 탄생했다.
진영호가 말했다. "쫓겨 쫓겨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 자다가도 웃음이 나왔다. 내가 봉이 김선달이지. 신기하고 이상했다. 의도해서 기다리지는 않았다. 굳이 내 자랑을 하자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새로운 방법으로 앞날을 꿈꿨다는 정도?"
모든 혁명은 미래를 꿈꾼다. 신세계를 세우려는 파천황(破天荒)을 꿈꾼다. 이서구를 위시해 18~19세기 실학자들이 꿈꿨던 이상 세계도 마찬가지였다. 그 꿈이 민초들에게는 전설과 설화로 변했고, 종교에서는 메시아와 미래불로 연결됐다. 뽕나무밭 말아먹고 상사맨으로 뛰던 초보 농사꾼이 수박 말아먹고 카네이션 말아먹고 폭설에 풍비박산 나고 마침내 보리와 메밀로 먹고살게 된 내력도 기실은, 혁명(革命)이다.
동학과 고창, 그리고 만석보
학원농장에서 서쪽으로 10분만 가면 동학혁명 발상지가 나온다. 공원으로 꾸민 이 작은 터에서 농민들은 가렴주구(苛斂誅求)에 죽창을 들었다. 1894년 2월 사방에서 몰려든 농민군은 죽창으로 무장해 고부로 북상했다. 고부는 정읍에 있다. 그때 고부 군수는 조병갑이었다. 가렴주구로 익산으로 쫓겨 갔다가 뭐가 미련이 남았는지 다시 돌아와 학정을 펴던 탐관오리였다.

조병갑은 백성들을 옥에 가두고 돈을 처먹고, 자기 아비 송덕비 건립 비용을 징수했다. 배들평야에 물을 대는 동진강 물을 만석보로 막아버리고 물세를 받아먹기까지 하자 혁명이 터졌다. 고부로 진군한 농민들은 고부 관아를 부숴 쌀 창고를 열었고 만석보를 뚫어 물을 풀었다. 이후 정세는 역사에 기록돼 있다. 청과 일본이 동학군 진압을 핑계로 조선에 들어와 전쟁을 벌였고 조선은 훗날 사라져버렸다. 그 흔적들은 고창과 정읍 곳곳에 남아 있으니, 학원농장 보리밭에 얽힌 사연보다 그 사연은 더 깊고 처연하다. 고부 관아도 사라지고 만석보도 사라졌다. 관아는 학교로 변했고 동진강 변 만석보 자리에는 낡은 말뚝들과 유지비가 서 있다.
전주로 도망갔던 조병갑은 1898년 대한제국 시절 판사로 복귀해 동학 접주 최시형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06년 당시 정부 고위직이던 그 증손녀는 "우리 (조병갑) 할아버지는 동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김해에는 선정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파천황의 꿈은 사라졌다. 미륵불은 현신하긴 할 것인가. 이서구가 채 못 읽은 비결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
[고창 여행수첩]